대장암 복부미용수술
2009.11.19 5184 관리자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환 치료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후 얼마나 삶을 편리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었다. 대장암 수술도 마찬가지이다.
대장암 수술시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도 수술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다.
첫째 신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공항문을 최대한 조성하지 않는 것이다. 직장암 수술 시에 환자와 가족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복부에 인공항문을 내고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환자분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수술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복부에 인공항문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분이 많았다.
인공항문을 최소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문후방접근법’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암수술을 하다보면 골반이 좁을 경우 암을 절제하고 항문 가까이에서 장을 연결하기 힘이 들다보니, 복부에 인공항문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항문 가까이에서 쉽게 연결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 항문 밑 즉 항문 후방부를 절개하여 암을 제거하고 손으로 봉합하는 수술을 개발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술식을 10년 전부터 하면서 인공항문을 내지 않고 항문을 살리는 율을 상당히 높였다.
또 한가지 방법은 Mason 술식이다. 이것은 필자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하부에 있는 직장암 환자 가운데, 항문제거를 강력히 거부하거나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은 분에게 근치수술은 아니지만 직장암을 국소적으로 제거하는 수술방법이다. 즉 항문 괄약근을 항문후방에서 완전히 절개하고 병변부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술식은 괄약근을 절개하므로 항문 힘이 없어지는 변실금을 우려하여 대장항문의가 잘 하지 않는 수술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수술방법으로 인공항문을 내지 않는 수술율을 상당히 높였다.
두번째는 복부 절개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법이다. 암조직을 신체 내 장기를 이용하여 배출하면 복부에 절개를 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복강경 수술 자체만으로는 암을 배출하기 위해 복부에 절개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장항문외과에서는 복강경 수술시 2년 전부터 여성은 자궁하부의 질 절개, 남성은 항문 아래부위 절개를 통해 암을 제거해왔다. 따라서 복부에는 4개의 구멍 흔적만 남게 되고 수술 후 1, 2년이 지나면 거의 수술흔적이 없을 정도로 복부미용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위의 술식은 주로 좌측 대장암환자에 적용해 왔다. 이 술식의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대장암을 절제하고 자동봉합기를 사용하여 복부 내에서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대장항문외과에서는 복부미용수술의 확대를 위하여 자동봉합기를 사용하지 않고 창자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장내시경 절제술을 하는 것이다. 우리 병원 대장암팀은 복부에 수술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장암이 진단되면 암수술을 위해 개복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절제술이 가능한지 점검하여 가능하면 대장내시경으로 암을 절제한다. 수술의 타당성 유무는 현미경 검사소견을 통해 확인한다.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팀은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수술경험이 선두그룹에 있으며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미경 검사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낮으며 수술을 해도 복강경으로 수술하므로 복부에는 수술상처는 거의 없다.
외과의는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는 수술을 할 때 단칼에 복부를 크게 절개를 하고 병 부위를 육안으로 보면서 과감하게 수술하는 의사를 ‘great surgeon(대단한 의사)’라고 하면서 대단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수술만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 흔적을 최대한 없애는 등 환자나 그 가족이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 환자들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 암 수술 후 생존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배옥석 교수 / 대장항문외과
● 상담 및 문의 : (053)250-7324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41931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대표전화 : 053-250-8114팩스 : 053-250-8025
COPYRIGHT (C) KEIMYUNG UNIVERSITY DAEGU DONGSAN HOSPITAL.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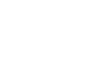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2021.9.30.~2026.3.29.

-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22.2.9.~2026.2.8.






